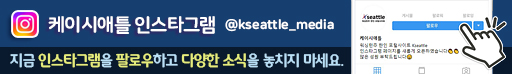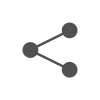미국 집값이 버티는 진짜 이유? “주인들이 시장서 집 빼는 중”

미국 전역에서 매물을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디리스팅(delistings)’ 사례가 급증하면서, 집값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주택 공급도 위축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 내 디리스팅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8월에는 증가율이 72%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가파른 상승세다.
통상 여름은 주택 거래가 활발한 시기지만, 올해 9월에는 디리스팅 증가 폭이 신규 매물 증가 속도의 3배를 넘어섰다. 8월 기준 신규 매물 100건당 28건이 시장에서 철회됐는데, 이는 지난해 16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팬데믹 기간 중 확보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꼽는다. 리얼터닷컴의 제이크 크리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주택 소유주가 팬데믹 당시 확보한 2~4%대의 낮은 모기지 금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 때문에 거래가 멈추고 시장 전체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주택 보유자의 약 70%가 금리 5% 이하의 대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17% 수준이다. 이런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매도자들이 기존 금리를 지키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고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증가세가 둔화됐다. 9월까지 24개월 연속으로 매물 수는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5월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8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는 한 달 전의 1.6% 상승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또 팬데믹 이후 집값 급등기를 경험한 주택 소유주들의 ‘심리적 기준’도 가격 인하를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KPMG의 옐레나 말레예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웃이 3년 전 집을 시세보다 10만달러 비싸게 팔았다면, 본인도 그 수준을 기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심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도시 지역에서는 디리스팅 비율이 특히 높다. 마이애미에서는 신규 매물 100건당 55건이, 휴스턴에서는 40건, 탬파에서는 33건이 시장에서 철회됐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있다. 여유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대출 상환 압박이나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는 매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인 애슐리 루터는 “많은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기보다 임대시장으로 돌리고 있다”며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일부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효과를 낳고 있지만,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