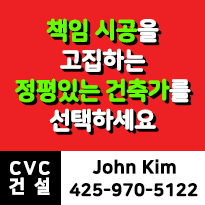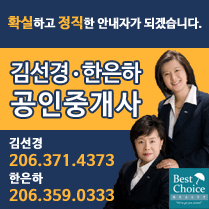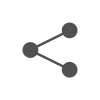한미동맹, 그 의미와 오늘의 과제
국제 정치에서 동맹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나 협력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맺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가치의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다시 말해, 동맹은 서로의 필요에서 출발하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동맹의 전형을 보여준다.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 속에서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통해 한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냈다. 그리고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한 전후 협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안전장치가 되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했고,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경제·문화 등 다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 ‘혈맹’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상징적 언어다.
![한미동맹70년] 한미 사이에 선 '중국', 동맹의 길을 묻다](https://img.kbs.co.kr/kbs/620/news.kbs.co.kr/data/fckeditor/new/image/2023/09/27/n00241695785260420.jpg)
그러나 동맹의 모습은 한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냉전 시대 소련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한 대표적 사례다. 일본과 미국, 호주와 미국 간의 양자동맹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견제하는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동맹은 국가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안보 불확실성을 상호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모든 동맹이 대등한 관계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맺어진 동맹은 구조적으로 불균형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동맹을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국은 안보를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동맹의 조건에서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 문제, 무기 구매 협상, 통상 정책 등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균형은 동맹이 때로는 상호 호혜가 아닌 ‘종속적 관계’로 비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직원 체포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게 한다. 미국 내 법 집행이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동맹국 국민의 권익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인식은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동맹이란 이름 아래 강대국의 이익만 우선시된다면, 약소국 국민의 일상과 권리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맹은 군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국민 개개인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직시하고, 동맹의 균형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단순히 안보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술·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 또한 동맹을 단순한 전략적 도구로만 보지 말고, 동맹국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실질적 협력자로서 접근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도전을 넘어 굳건히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동맹의 가치는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현재의 실천과 미래의 신뢰에서 확인된다.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구조적 차이를 넘어, 동등성과 상호존중을 실현할 때 한미동맹은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맹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균형 있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외교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글쓴이 LaVie
- 전 금성출판사 지점장
- 전 중앙일보 국장
- 전 원더풀 헬스라이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