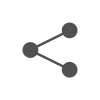인간의 기적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최근 ‘아기를 낳는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결합해, 배아의 발달 과정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인공 자궁에서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의 진보라기엔 경이롭고, 동시에 섬뜩하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보완해왔다. 인공심장은 맥박을 이어주고, 인공지능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준다.
그러나 ‘생명 창조’는 조금 다르다. 아이를 품고 태어나게 하는 과정은 단순한 생물학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세대를 잇는 의미가 깃든 행위다. 로봇이 이를 대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

윤리적으로도 질문이 많다. 출산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생명의 시작을 기계 안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부모의 선택권과 아이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기술은 가능성을 열지만, 그 가능성을 어디까지 허락할지는 인간이 결정해야 한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더 깊은 질문이 나온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했다고 말한다. 이는 생명이 단순한 분자 조합이 아니라, 신의 숨결과 뜻이 깃든 존재임을 뜻한다.
만약 로봇이 생명을 만들고 키우는 일을 한다면, 그 생명은 단지 ‘기술의 산물’일까, 아니면 여전히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일까?
우리가 기술로 창조의 방식을 재 해석할 때, 그 본질적 의미를 흐리게 한다면,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게 될 위험에 처한다.
신은 인간에게 창조적 지능을 주셨지만, 동시에 겸손을 요구하셨다.
창조의 권한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만약 우리가 생명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면서도, 그 생명을 기계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신이 부여하신 창조의 선물을 거꾸로 훼손하는 셈이다.
결국 문제는 기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우리의 영적 성숙에 달려 있다.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한계선은 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룩한 경계’다. 생명을 만드는 손이 강철인지, 따뜻한 살결인지—그 차이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 글쓴이 LaVie
- 전 금성출판사 지점장
- 전 중앙일보 국장
- 전 원더풀 헬스라이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