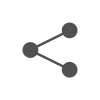커피 한 잔에 담긴 세계정세
한 여름 빼고 거의 매일 부슬비가 내리는 시애틀 처럼 커피가 잘 어울리는 곳은 없을 것이다. 커피를 사랑하는 나에게 시애틀에 산다는 것은 커피와 함께하는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늘 그렇듯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는다. 커피는 나에게 하루의 알람이자 위로다. 일상은 그 잔의 온도에서부터 서서히 깨어난다. 시애틀에 산다는 건 곧 커피의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곳은 스타벅스의 고향이자, 크고 작은 로컬 카페들이 동네 어느 곳이든 반겨주는 커피 애호가들의 성지다.
나 역시 그 애호가 중 하나다. 하루 다섯 잔은 꼭 마신다. 아침엔 진한 에스프레소로 정신을 깨우고, 점심엔 산미가 있는 아메리카노로 기분을 환기시킨다. 오후엔 부드러운 라떼로 마음을 달래고, 저녁 무렵엔 디카페인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한다. 커피는 나의 시간이고, 나만의 언어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질 커피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정책 때문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며, 미국 커피 수입량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나라가 관세 부담을 이유로 미국 시장에서 발을 뺀다면, 우리 일상의 향기는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변화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브라질산 아라비카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으로 사랑받아 왔고, 시애틀의 수많은 로스터리들이 이를 기본으로 블렌딩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일부 원두는 품절되고, 가격표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의 바리스타는 “이번 달 로스팅은 에티오피아 쪽으로 바꿨어요”라고 말한다. 분명 좋은 원두지만, 브라질 원두 특유의 풍부한 풍미는 사라졌다. 작은 변화이지만, 매일 커피를 마시는 이들에겐 충분히 예민하게 다가온다.
정치와 무역의 줄다리기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일상들이 휘청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입 규제라기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브라질의 외교적 스탠스를 겨냥한 전략적 반응이다. 브라질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을 강화해 왔고, 미국은 이에 대해 커피·설탕 등 일부 품목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대응한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커피 가격의 상승뿐 아니라, 커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생산지 농부에서부터 바리스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브라질은 현재 가뭄과 고온에 시달리고 있어 커피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다. 커피나무는 예민하다. 기온, 강수량, 토양의 성질까지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품질이 크게 흔들린다.

결국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그 한 잔 안에는 기후위기, 국제정세, 공정한 노동의 문제까지 녹아 있다. 우리가 그저 ‘맛’으로만 여겼던 향과 산미, 무게감 뒤에는 수많은 현실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공정무역 원두를 선택하고, 지속가능한 재배 방식을 지지하는 브랜드에 눈을 돌리는 것.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마시는 커피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마시는 일.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 실천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커피 문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커피 향이 바뀌는 날이 온다 해도, 그 향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시애틀의 회색빛 하늘 아래, 커피는 여전히 나를 감싸 안는다. 다만 이제 그 잔에 담긴 따뜻함 속엔 조금 더 많은 세계가 녹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글쓴이 LaVie
- 전 금성출판사 지점장
- 전 중앙일보 국장
- 전 원더풀 헬스라이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