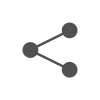MZ 세대의 눈에 비친 '헬조선'의 풍경…영화 '한국이 싫어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뉴질랜드로 떠난 20대 여성 이야기

영화 '한국이 싫어서'의 한 장면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물여덟 살 직장인 계나(고아성 분)는 한국 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겹다.
한국에서 '경쟁력 없는 인간'인 그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표범에게 잡아먹히는 톰슨가젤처럼 '멸종돼야 할 동물'인 것만 같다.
계나에게 한국은 '헬조선'일 뿐이다. 결국 그가 선택한 건 '탈(脫)조선'이다.
4일 막을 올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한국이 싫어서'는 탈조선을 택한 청춘의 이야기다. 장강명 작가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한국에서 계나의 삶을 채운 건 인천과 서울 강남을 오가는 지옥 같은 출퇴근 길, 온갖 불합리를 견뎌야 하는 직장 생활,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서열화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계나의 좌절감은 꽤 잘사는 남자친구 지명(김우겸)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극에 달한다.
뉴질랜드에서 계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만만치는 않다. 계나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고, 학위를 따고,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백인들의 인종차별도 넘어야 할 벽이다.
이 영화는 계나의 삶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대신, 한국에서의 삶과 뉴질랜드에서의 삶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두 개의 삶을 대비한다. 한국은 대체로 어둡고 쓸쓸한 겨울의 풍경으로 그려져 헬조선의 느낌이 극대화된다.
한국의 늦은 밤 술자리에서 계나와 친구들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행복을 찾아 떠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고, 한국에 남아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호기롭게 주장하는 친구도 있다.

영화 '한국이 싫어서'의 한 장면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한국이 싫어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 영화는 관객을 가르치듯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한국 사회를 현실 그대로 바라보는 데 주력한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춘의 시점을 충실히 따른 점이 이 영화의 미덕일 것이다.
곱씹어볼 만한 질문도 던진다. 한국 사회에서 불행한 사람이 늘어갈수록 역설적으로 행복이란 말은 더 많이 쓰이고, 그러면서 행복의 의미도 점점 공허해지는 게 아니냐는 계나의 의문 같은 것들이다.
한국에 남는 게 맞는지, 외국으로 떠나는 게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계나가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넘어 정신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건 추위가 싫어 남극을 떠났다는 동화 속 펭귄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아 모험에 나서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고아성은 한국 사회에서 고뇌하는 청춘을 빼어나게 연기했다. 그의 연기는 마치 MZ 세대를 대변하는 듯하다.
장건재 감독은 '진혼곡'(2000), '싸움에 들게 하지 마소서'(2003), '꿈속에서'(2007) 등 단편 연출을 거쳐 '회오리바람'(2009)으로 장편에 데뷔했다. 이어 장편 '달이 지는 밤'(2020), '5시부터 7시까지의 주희'(2022),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2022) 등을 연출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